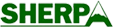문화사로서의 한국학의 조건과 사명-휴즈의 냉전시대 한국의 문학과 영화를 통해 본미국 한국학의 단계들-
휴즈의 냉전시대 한국의 문학과 영화는 냉전기 ‘대한민국’이 자기의 담론적 경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당시의 문학과 영화 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추적하고 있는 책이다. 저자는 그러한 정체성 정치의 핵심은 일본제국, 북한, 미국이라는 시공간적 타자를 처리하는 방법들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 책은 냉전시대 남한의 한국 내셔널리즘에 대한 분석이지만, 일제시대와 해방공간(1945-1948)까지도 포괄하게 된다. 이처럼 광범위한 문화 텍스트들의 분석을 통해 저자는, 정치적으로 식민지, 전쟁, 혁명, 분단, 개발 독재 등의 격변을 겪은 근대 한국의 역사로부터,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이데올로기소들을 지목하고 그들끼리의 교섭 양상을 드러낸다.
근대 한국의 문화적 역사를 목표로 하면서, 저자는 특히 문화 텍스트에 나타난 언어성과 시각성의 관계에 주목한다. 소설 등의 언어적 텍스트에서 역사적 현실을 재현할 때 발생하는 어긋남이나 생략, 의미론적 미끄러짐 등은 시각적인 것이 언어를 간섭/교란하는 현상으로, 영화 같은 시각적 텍스트에 재현된 현실의 복잡성과 애매성은 언어적인 것의 직접적 재현으로 해석된다. 결국 언어적인 것과 시각적인 것의 상호 규정 속에서 문화는 현실의 복잡성의 이차적 재현물로 규정되며, 문화 텍스트는 단독성의 장소가 되지 못한 채 현실을 규정하는 이데올로기소들이 경합한 흔적으로 남는다.
이러한 해석학은, 역사적 현실의 무한한 다층성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장으로 문화를 취급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객관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현실 정치의 과정으로부터 텍스트를 추방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허무주의라는 의외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역사적 상황에 종속된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역사의 바깥에 위치시킴으로써 문화 연구의 역사성을 구제하는 방향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학’이 지역학이라는 편제를 벗어나 보편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기도 하다.
- Publisher
-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 Issue Date
- 2014-11
- Language
- Korean
- Citation
사이間SAI, no.17, pp.439 - 468
- ISSN
- 1975-7743
- Appears in Collection
- Files in This Item
-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