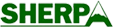이효석의 「마작철학」과 문화 현상으로서 ‘정어리 열풍’Lee Hyo-Seok’s The Philosophy of Mahjong and the “Sardine Syndrom” as a Cultural Phenomenon in Colonial Korea, 1923-1942
「마작철학」(1930)은 1920~30년대 조선을 뒤흔들었던 ‘정어리 열풍’을 모티브로 한 이효석의 초기작으로, 동반자 작가로서 이효석의 문학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 서사의 기본 구조는 흩어져서는 한없이 무기력한 노동자들이지만 단결하여 투쟁하면 기필코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사회주의 판타지 서사’의 기본 구조에 이어진다. ‘정어리 열풍’은 「마작철학」의 제재이면서 동반자 작가 이효석이 지향하는 세계를 보여주기 위한 서사의 핵심 모티브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사에서 1920~30년대 ‘정어리 열풍’이라는 문화사적 관점에서 「마작철학」의 문학적 성취를 검토한 연구는 찾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본 연구는 1923년부터 1942년까지 동해안에 나타난 어마어마한 양의 정어리 떼가 불러온 식민지 조선의 산업과 문화의 변화라는 문화사적 맥락에서 「마작철학」의 문학사적 의의를 구명한다. 정어리 산업은 1단계 어업, 2단계 온유비(鰮油肥) 가공업, 3단계 경화유 제조업 등 조선과 일본에 걸쳐 수직적으로 분화된 3단계 산업으로 구성된다. 각 단계의 산업은 ‘정어리’(1차 원료) ⇒ ‘온유비’(중간생산물) ⇒ ‘경화유’(최종생산물)의 수직적 분업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이효석은 이렇듯 수직적으로 분화된 정어리 산업을 통해 몰락이 예정된 조선인 소자본가의 운명을 형상화했다. 「마작철학」은 자본주의의 계급적 모순과 갈등을 완화하거나, 두 계급 사이 화해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제3계급으로서 ‘소자본가’ 계급을 발견했다는 점에서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제3계급은 자본가, 노동자 두 계급 중 어느 하나로 수렴될 운명이므로 노동자의 편을 들어야 한다는 식의 손쉬운 화해로 성급히 마무리된다. 이는 이효석의 한계이기 이전에 자본주의가 미성숙했던 1920~30년대 조선의 시대적・사회적 한계였다.
- Publisher
- 한국현대문학회
- Issue Date
- 2022-04
- Language
- Korean
- Citation
한국현대문학연구, no.66, pp.195 - 233
- ISSN
- 1229-2052
- Appears in Collection
- HSS-Journal Papers(저널논문)
- Files in This Item
-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